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난 10년은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해도 금호그룹은 거칠 것이 없었다.
한때 대우건설을 인수하려고 중견 건설 회사들과 대기업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 도급 순위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았고 국내외 신인도 역시 최상위에 있었다.
금호 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 군침을 흘리며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다.
그러나 다른 기업에 비해 인수금액을 높게 적시한 금호그룹에 낙착되었다.
서울역 앞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잡은 대우건설 본사 사옥에는 금호그룹의 ‘로고’가 걸렸다.
2년 뒤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금호 그룹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대표적인 자산주로 알려진 대한통운은 알짜 회사였다.
이들 기업의 인수로 금호는 단숨에 재계 순위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승자의 저주’였을까.
금호의 확장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건설경기 불황과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그룹에 직격탄을 안겨주었다.
무모한 몸집 불리기에 대한 역풍은 너무 거셌다.
급기야 그룹측은 인수 3년밖에 안된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통운 역시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몰렸다.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지 않고는 그룹 자체가 존립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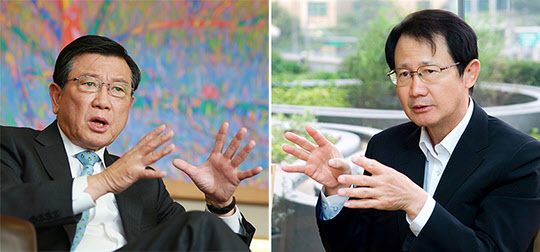 |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 /조선일보 DB |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형제간 우애에도 금이가고 말았다.
금호그룹은 박인천 창업주가 사망한 1984년 이후 장남 차남 3남으로 이어지는 형제간 경영이란 독특한 지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남인 박성용 회장(2005년 작고)은 만 65세가 되는 해인 1996년 그룹 경영을 동생인 박정구 회장(2002년 타계)에게 물려줬다.
큰 형이 동생에게 경영권을 이양할 때 재계에선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형제간 독특한 의리 경영이 또 다른 경영권 이양 모델로 제시됐다.
두산 그룹 역시 금호를 모델로 삼아 형제간 경영을 실현했다.
차남인 박정구 회장이 갑자기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3남인 박삼구 회장이 경영 대권을 물려받았다.
박삼구 회장 재임시절 굵직한 기업 인수 합병(M&A)을 성사시키며 그룹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룹의 유동성 위기라는 절대절명을 맞게 됐다.
이를 주시하던 4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반기를 들었다.
2009년 초의 일이었다.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주식 지분율을 높이며 형인 박삼구 회장의 경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형제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도 이 시점이었다.
그룹은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애 좋기로 소문나 있던 형제가 집안 싸움까지 벌이는 사태로 발전했다.
그룹은 그야말로 풍지박산 일보 직전이었다.
박삼구 회장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생인 박찬구 회장과 동반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때가 2009년 7월18일이다.
박삼구 회장의 퇴진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2개군으로 쪼개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 Premium Chosun ☜ ■ 홍성추 조선일보 객원기자(재벌평론가) sch8@naver.com
草浮
印萍
박삼구 회장이 인고의 세월 덕택에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석유화약 분야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독자 경영하는 쪽으로 분가 되었다.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들은 채권단 산하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았다.
금호 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의 요구로 2010년 11월 다시 ‘회장’으로 복귀했다.
박 회장은 100대 1로 감자를 실시했고 사재 3300여원을 출연하는 모험도 강행했다.
이러한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그룹 운영에 조금씩 숨통이 트기 시작했다.
현금 자산이 될만한 계열사들이 여지 없이 팔려 나갔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이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었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금호산업은 올해들어 부채비율이 400%까지 떨어졌다.
한때 3만%에 달하던 금호타이어의 부채비율도 200%미만까지 낮출 수 있었다.
2015년부터 박삼구 회장과 주채권단과의 인수가격 협상이 시작되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은 우선 인수권이 채결돼 있었다.
금호산업의 전체 주식 50%+1주를 박 회장한테 팔기로 약정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호산업 주식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지리한 협상을 벌어야 했다.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박 회장과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려는 채권단과의 줄다리기가 몇 달 동안 계속 되었다.
그러다 최근 채권단의 최종 가격이 제시되었다.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제시할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 인수가격을 주당 4만1213원 총 7228억원으로 결의했다.
채권단이 처음에 1조218억원을 제시하자 박 회장은 6503억원을 불렀고 박 회장이 다시 7047억원을 제시하자 채권단이 7228억원으로 최종 조정했다.
10년 동안 금호 그룹은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그 와중에 알토란 같은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아픔도 맛봐야 했고 형제간 ‘재산싸움’이라는 치욕을 맛보기도 했다.
 | ▲ 박삼구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조선 DB |
박삼구 회장은 잃은 것만 있는 것일까.
이번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은 박삼구 회장가(家)엔 상처보다 영광이 더 큰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가장 큰 이득은 형제간 지분정리가 ‘깔끔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박삼구 회장은 위로 두 형이 있고 밑으로 두 동생이 있다.
두 형은 돌아가셨지만 조카들이 모두 건재해 있다.
큰 형인 박성용 회장의 아들인 장조카는 일찍이 경영 일선에 물러나 있었다.
혼혈인 박재영씨는 미국에서 영화사업을 한다며 지분을 정리,그룹 경영과는 무관해 있었다.
그러나 둘째 형인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금호석유 화학 상무는 그룹 경영에 관여하며 지분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
박 상무가 삼촌간 갈등에서 박삼구 회장편이 아닌 박찬구 회장 편에 들면서 지분 정리가 쉽게 되었다.
결국 박철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쪽으로 옮겨가는 형국이 되었다.
박찬구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준경 상무는 당연히 금호석유화학 경영에 나서게 됐다.
현재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에는 박찬구 회장의 1남1녀 자식들과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 각기
‘상무’ 직책을 맡아 경영에 합류하고 있다.
5형제 중 막내인 박종구 전 과기부 차관은 처음부터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었다.
물론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8월 CP 매입과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등
갈등이 안풀렸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9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고 있다.
형제간 앙금이 아직도 깊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은 10년의 인고의 생활을 견뎌내면서 형제간 지분 정리도 ‘자연스럽게’ 이루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형제간 경영의 모델에서 형제간 갈등집안으로 전락했던 금호가(家) 역시 기업 분할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은 역시‘기업 총수 자리’는 나눌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계에선 이와 유사한 두산가(家)의 다음 경영권 이양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금호가의 지분 정리가 두산가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까하는 관심에서다.
☞ Premium Chosun ☜ ■ 홍성추 조선일보 객원기자(재벌평론가) sch8@naver.com
草浮
印萍
|